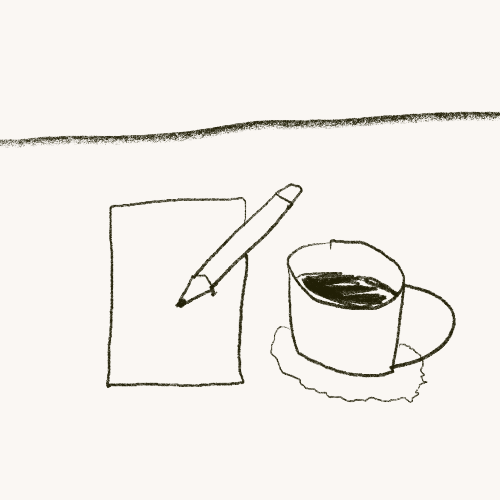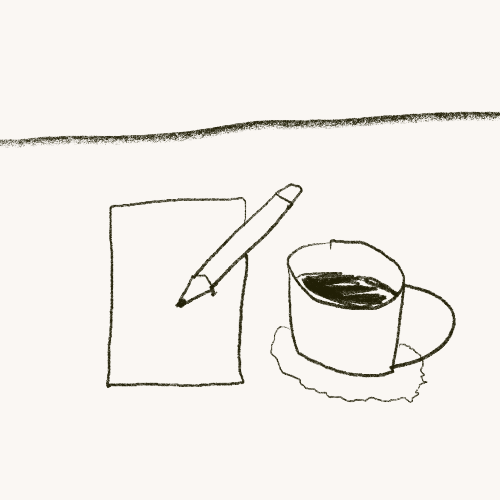좋아하는 편집자 님이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나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보세요.”
결국 뽑힌 사람은 '그럼에도', 정확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고 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뜻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나를 설명한다는 건 꽤나 낭만적으로 들렸다.
지난 몇 년 간의 일들을 두고 나는 괄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넣어 회고했다. 두 시간짜리 영화를 이어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싹 고쳐줄 의사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판매가 잘 안 되어서 두 세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모아둔 돈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책 제목을 빌린다면-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한갓진 오후에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영은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잘못쓰인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었던 거야. 거기가 틀리니까 뒤에가 틀렸던 거야.”
“무슨 말이야?”
영은이 되물었다.
집에 돌아와서 '쓰는 사람으로 살기' 파일을 열어 작년에 써둔 회고 글을 찾았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뉘앙스로 쓰인 모든 문장을 ‘그래서'로 바꿔 써봤다. 그렇게 쓰고 나니 수정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다.
기대하던 일이 엎어졌음에도 그럭저럭 다른 수업을 열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대하던 일이 미뤄진 탓에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나의 일이 무기한 연기되어도 나는 여전히 숨 쉬고 있었고, 둘러보니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보였다. 하나의 일에 목숨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증상이 가장 안 좋아졌을 때 급박한 마음으로 의사 쇼핑에 나섰다. 동탄까지 왔다갔다 일주일에 서너시간을 세 번씩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매주 PT와 요가를 하면서도 몸은 자꾸 삐걱댔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몸을 외주 주지 않고, 내가 내 몸에 대해 천천히 공부해보기로, 또 아픔과 함께 살아가기로 말이다. 30분만 앉아도 진땀이 나는 몸뚱이는 벼락치기하는 습관을 완전히 고쳐놨다. '하루에 하나만 배우자'를 실천한 것은 어쩌면 처음이었다. 내 병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고쳐줄 의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 게 아닐까. 의지할 의사를 찾았다면 나는 내 몸을 그에게 완전히 내던졌을 것이다.
그 시기 프로그램 판매가 잘 안 되어서 무척 힘들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판매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깨지면서 '내가 옳다'는 건방진 생각을-다는 아니고-반쯤 버렸다. 소수 정예로 수업을 하게 되다보니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접촉면이 넓어졌다. 자세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이 보강되고 다듬어졌다. 판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시선을 사람들에게로 비로소 옮기게 되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고, 어떤 부분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봤다.
하루는 참을대로 참다가 겨우 아빠에게 토해내듯이 말했다.
"잘 지내고 있냐? 일 잘하고?"
"아빠, 나 요즘 일 쉬고 있어."
"왜."
"몸이 좀 안 좋아."
아빠는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점점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언성을 높였다. 대체 얼마나 운동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썼길래 몸이 그렇게 됐냐며 나무라다가, 대답을 재촉했다. 디스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아프냐는 둥,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는 둥, 니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게 틀림없다는 둥,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가 이어졌다. 아빠는 혼자서 허공을 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나를 바라봤다.
"우냐?"
아빠는 이후로 가끔씩 투박한 카톡을 보내왔다.
"돈 떨어졌을 것 같아서 좀 보냈다."
내가 기대한 아빠는 보라색 얼굴을 하고 아프다는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빠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믿음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일을 하지 못해도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았고, 중요한 관계는 오히려 도타워졌다. 두려워하던 장면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었다. 자유로웠다. 힘들었던 이 시기 정말 많은 변화가 나를 찾아왔다.
부서지고 깨지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늘 살아가던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도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쩌면 저 깊이에서는 언뜻 알고 있었다. 내 안의 엉킨 부분이 점점 더 빠르게 덩치를 불려가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일정한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도. 모든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가 깨지듯 누적적이다. 무너져 내린 것도, 일어선 것도 아주 사소한 일-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떠올린 일– 때문이었다. 사실 그 사소한 일은 수없이 떨어진 물방울 중 하나였을 뿐이겠지만.
회사를 정리하면서 ‘힘든 일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틴 것'에 대한 존중 어린 말들을 최근 들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체력이 생긴 게 아닐까? 그게 훨씬 진실에 가까워보였다.
고통의 본질은 뭘까? 그걸 떠올릴 때면 나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내가 하는 일에도, 내 삶에도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고통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한 사람의 아픔은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또다른 이유가 되었다. 왜 고통은 또 고통을 낳을까. 왜 이 사회는 트라우마로 뒤덮혀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비극이 있을까. 고통은 자꾸만 흘러넘쳤다. 고통은 왜 있는 걸까?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래서'로 고쳐쓰면서 밀려드는 감동을 느꼈다. 그때 나는 고통에 코를 박고 있었다. 떨어져서 보니 고통 뒤편이 보였고, 고통의 본질이 고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로 고통이 고통이 되었다. 고통이 없다면 평화도, 기쁨도, 성장도 없었다. 여럿이 없다면 하나도 없고, 밝은 곳이 없다면 어두운 곳이 없고,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면 삶이 아름다울 수 없었다. 고통을 담기 위해 받치고 있던 바가지는 필요하지 않았다. 고통은 흘러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구름이 되었다. 고통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디자이너와 새로 만들 브랜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이곳이 회복과 성장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회복과 성장은 좀 대치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장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복도 성장이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답하고 말았다.
이제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졌다. 회복만큼의 성장은 없다.
틱낫한 스님은 이 말을 자주 인용하셨다. ‘진흙 없이 연꽃은 없다. No Mud No Lotus.’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 no pain no gain’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미묘하게 다른 말이다. 그건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취하거나 얻을 것이 있다는 의미다. ‘진흙 없이 연꽃은 없다’는 연꽃을 취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연꽃이 연꽃으로 자라고 피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고통은 흙이 아닐까. 포도를 키울 때 땅이 주는 시련은 포도에게는 대단한 고통일지도 모른다.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며 강인한 생존력을 갖추고, 볕을 보기 위해 제멋대로 휘고, 그만의 색깔과 풍미를 갖추며 자라난다. 인간들은 맛있는 와인을 팔겠다며 척박한 포도밭을 고르기 위해 아우성이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주어진 땅에 대해 불평하곤 한다.
목마르고, 애달프고,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경험은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찾아온 불행이 아니었다. 액땜도 아니고, 견디고 참아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흙을 두고 ‘딛고 이겨낸다'는 표현을 쓰는 건 영 어색하게 들린다. 흙을 딛을 수 있어도, 흙을 결코 이겨낼 수는 없다. 우리는 흙에서 자란다.
이렇게 바라보니 흙은 더이상 ‘견딤'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가 견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아픔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흙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지고 피기를 반복하듯이 말이다. 세상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고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이제는 다시 쓰고 싶다. 삶에 아픔이 있어서 나는 내가 되고, 우리는 우리가 된다.